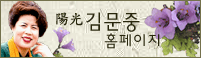협회 뉴스 - 협회 소개
글 수 279
한국시낭송가협회의
경포나들이




2005년 12월 28일
나는 초대를 받고 경포바다로 갔다. 그동안 서로 친분을 두텁게 했던
분들을 불러 모아 가벼운 차라도 한 잔 나누는 것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하는데 축제의 장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몇해 전에 일이지만,
23년의 군생활을 접으려고 동해시에 있는
해군1함대사령부에 내려와 근무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대망의 1997년의 새해가 밝았고
그해 현충일 추모헌시가 전국적으로 공모가 있었는데
운좋게 내가 지은 시가 전국 3,000명 공모에서 최고상을 받아
거금의 상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군무에 임하고 있던 나는 아내로 하여금 포상을 받도록하였음에 잘했다고 생각했다.
밤을 지새면서 시를 쓰거나 하루 온 종일 방안에 틀어박혀 붓글씨를 쓰는
남편을 달갑지않게 생각하는 아내를 대리 포상을 받도록한 것은 나의 꿍꿍이
수작인 면피였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6월 6일이 다가오면서 분주해졌다.
행사 당일 낭송될 시가 A4 용지로 장장 일곱장이었으니
장시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그 시를 낭송할 사람을 선정해야했는데 수많은 대상자 중에서
한국시낭송회장인 김문중여사(당시 서울어머니 시낭송회장)가 추서된 것이었다.
그녀에게 낭송할 시의 원고가 언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행사 당일 동작동 국립현충원(당시 국립묘지)에서 낭송되었으며
나의 시는 전국방송을 타고 울려 퍼진 것이었다.
참으로 얄궂은 것은 그 행사가 있을 전날 밤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들을 만나 밤새도록 맥주 한 박스를 마신 다음
잠들었는데 세상에 일어나보니 아침이 훤하게 밝아 불이나케
택시를 잡아타고 도착했더니 내 자리(김영삼대통령과 나란히)에
이미 다른 분이 앉아 있으니 나는 將聖 자리에 앉아 행사를 지켜보아야했었다.
행사가 끝나고
1주 후 국가보훈처장관의 점심식사초대를 받았는데
여의도의 어느 식당에서 김여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이끌었던 광화문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솝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그녀와 헤어져 지금까지 왕래가 없었다.
그런데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 낭송회를 강릉 경포에서 한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를 만났고 황금찬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저녁 7시 30분이 가까워지면서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건물 6층 시낭송회장소로 갔었다.
나도 낭송할 詩를 한 수 준비했는데 이미 황금찬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에 황선생님의 시'행복'을 암기하던 중이었다.
그녀를 만났고 황금찬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시낭송은 시작이 되었고 오래 전에 내가 쓴 졸시
'행복찾기'도 낭송이 되었다.

내가 살았던 경포의 밤은 늘 가깝게 있다.
잠시 경포해수욕장을 벗어나 북으로 가노라면 인공폭포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내가 살던 곳이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작은 스레트집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경포바다를 인접하여 있는 사근진은 아내의 고향이다.
멍개바위에 올라 사랑을 노래했던 시절이 생경된다.
그래서 시인이되었고 그런 분위기가 익는 가운데 그 또한 장소와
때마다 나의 기억을 담금질하는 시들이 꿈틀거린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물같이 까닥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밀이냐
<유치환의 시 그리움>

아주 짧은 詩 이지만 내가 애송하는 詩 중에 한 편이다.
짝사랑의 가슴앓이를 토해낸 시는 바로 어떤 연인의 이야기이다.
시낭송은 시작이 되었고 오래 전에
내가 쓴 졸시 '행복찾기'도 낭송이 되었다.
내가 단상에 올라가서 보기좋게 낭송해야할
시를 결국 낭송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하지만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암송하면서 소개한다.

밤이 깊도록
벗할 책이 있고
한 잔의 차를 마실 수 있으면 됐지
그 외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친구여
시를 이야기할 수있는
연인은 있어야하겠네
마음이 꽃으로 피는
맑은 물소리
승부에 집착하지 말게나
삼욕이 지나치면
벗을 울린다네
<황금찬의 시 행복>
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에 닿는 시인가. 우리가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곁에 시를 이야기하는 연인을 두는 것이다. 외롬의 아파 우는 이여, 연인이 있다면
그 정말 나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는 연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만남이란 추억을 만드는 것, 경포의 하룻밤을 그렇게 아쉽게 작별을 했다. 우린 누구를 사랑해야하고 누구를 그리워해야한다.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야한다. 그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슬픈가.
해를 바라듯 지금도 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아 오겠지만
그들은 얼마나 좋은 해를 맞이할런지 모른다. 해를 맞이한다는 것,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해가 새롬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연습인
것이다.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지나치는 산과 들이 지나간다지만 산과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녀와 아쉬운 작별을 해야했었다. 나는 밤이 이슥할 무렵 집으로 왔었다.
그녀가 원하듯이 나 또한 한국의 국민이 시를 좋아하고
시를 낭송함으로 생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남겨두고 말이다.
그래서 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가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것이다.
오랜 벗으로 숙명적이지 않아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말이다.
경포나들이
2005년 12월 28일
나는 초대를 받고 경포바다로 갔다. 그동안 서로 친분을 두텁게 했던
분들을 불러 모아 가벼운 차라도 한 잔 나누는 것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하는데 축제의 장에 초대를 받은 것이다.
몇해 전에 일이지만,
23년의 군생활을 접으려고 동해시에 있는
해군1함대사령부에 내려와 근무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대망의 1997년의 새해가 밝았고
그해 현충일 추모헌시가 전국적으로 공모가 있었는데
운좋게 내가 지은 시가 전국 3,000명 공모에서 최고상을 받아
거금의 상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군무에 임하고 있던 나는 아내로 하여금 포상을 받도록하였음에 잘했다고 생각했다.
밤을 지새면서 시를 쓰거나 하루 온 종일 방안에 틀어박혀 붓글씨를 쓰는
남편을 달갑지않게 생각하는 아내를 대리 포상을 받도록한 것은 나의 꿍꿍이
수작인 면피였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6월 6일이 다가오면서 분주해졌다.
행사 당일 낭송될 시가 A4 용지로 장장 일곱장이었으니
장시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그 시를 낭송할 사람을 선정해야했는데 수많은 대상자 중에서
한국시낭송회장인 김문중여사(당시 서울어머니 시낭송회장)가 추서된 것이었다.
그녀에게 낭송할 시의 원고가 언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행사 당일 동작동 국립현충원(당시 국립묘지)에서 낭송되었으며
나의 시는 전국방송을 타고 울려 퍼진 것이었다.
참으로 얄궂은 것은 그 행사가 있을 전날 밤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들을 만나 밤새도록 맥주 한 박스를 마신 다음
잠들었는데 세상에 일어나보니 아침이 훤하게 밝아 불이나케
택시를 잡아타고 도착했더니 내 자리(김영삼대통령과 나란히)에
이미 다른 분이 앉아 있으니 나는 將聖 자리에 앉아 행사를 지켜보아야했었다.
행사가 끝나고
1주 후 국가보훈처장관의 점심식사초대를 받았는데
여의도의 어느 식당에서 김여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가 이끌었던 광화문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솝에서 차 한잔을 마시고
그녀와 헤어져 지금까지 왕래가 없었다.
그런데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 낭송회를 강릉 경포에서 한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를 만났고 황금찬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저녁 7시 30분이 가까워지면서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건물 6층 시낭송회장소로 갔었다.
나도 낭송할 詩를 한 수 준비했는데 이미 황금찬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에 황선생님의 시'행복'을 암기하던 중이었다.
그녀를 만났고 황금찬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시낭송은 시작이 되었고 오래 전에 내가 쓴 졸시
'행복찾기'도 낭송이 되었다.
내가 살았던 경포의 밤은 늘 가깝게 있다.
잠시 경포해수욕장을 벗어나 북으로 가노라면 인공폭포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내가 살던 곳이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작은 스레트집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경포바다를 인접하여 있는 사근진은 아내의 고향이다.
멍개바위에 올라 사랑을 노래했던 시절이 생경된다.
그래서 시인이되었고 그런 분위기가 익는 가운데 그 또한 장소와
때마다 나의 기억을 담금질하는 시들이 꿈틀거린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물같이 까닥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날 어쩌란 밀이냐
<유치환의 시 그리움>
아주 짧은 詩 이지만 내가 애송하는 詩 중에 한 편이다.
짝사랑의 가슴앓이를 토해낸 시는 바로 어떤 연인의 이야기이다.
시낭송은 시작이 되었고 오래 전에
내가 쓴 졸시 '행복찾기'도 낭송이 되었다.
내가 단상에 올라가서 보기좋게 낭송해야할
시를 결국 낭송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하지만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암송하면서 소개한다.
밤이 깊도록
벗할 책이 있고
한 잔의 차를 마실 수 있으면 됐지
그 외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친구여
시를 이야기할 수있는
연인은 있어야하겠네
마음이 꽃으로 피는
맑은 물소리
승부에 집착하지 말게나
삼욕이 지나치면
벗을 울린다네
<황금찬의 시 행복>
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에 닿는 시인가. 우리가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곁에 시를 이야기하는 연인을 두는 것이다. 외롬의 아파 우는 이여, 연인이 있다면
그 정말 나를 바라보며 웃음을 짓는 연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만남이란 추억을 만드는 것, 경포의 하룻밤을 그렇게 아쉽게 작별을 했다. 우린 누구를 사랑해야하고 누구를 그리워해야한다.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야한다. 그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슬픈가.
해를 바라듯 지금도 해를 맞이하려는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아 오겠지만
그들은 얼마나 좋은 해를 맞이할런지 모른다. 해를 맞이한다는 것,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해가 새롬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연습인
것이다.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지나치는 산과 들이 지나간다지만 산과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녀와 아쉬운 작별을 해야했었다. 나는 밤이 이슥할 무렵 집으로 왔었다.
그녀가 원하듯이 나 또한 한국의 국민이 시를 좋아하고
시를 낭송함으로 생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남겨두고 말이다.
그래서 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가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것이다.
오랜 벗으로 숙명적이지 않아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