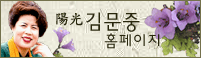문학회 원고 - 백양 문학회
정 동 진
정호승 (낭송 / 김순선)
밤을 다하여, 우리가 태백을 넘어온 까닭은 무엇인가
밤을 다하여, 우리가 새벽에 닿은 까닭은 무엇인가
수평선 너머로, 우리가 타고 온 기차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각자 가슴을 맞대고, 새벽 바다를 바라본다.
해가 떠오른다.
해는, 바다 위로 막 떠오르는 순간에는, 바라볼 수 있어도
성큼 떠오르고 나면, 눈부셔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다.
우리가, 누가 누구의 해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만, 서로의 햇살이 될 수 있을 뿐
우리는 다만, 서로의 파도가 될 수 있을 뿐
누가 누구의 바다가 될 수 있겠는가?
바다에 빠진 기차가 다시 일어나, 해안선과 나란히 달린다.
우리가 지금, 다정하게 철길 옆 해변 가로, 팔짱을 끼고 걷는다 해도
언제까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겠는가?
동해를 향해 서 있는, 저 소나무를 보라
바다에, 한쪽 어깨를 지친 듯이 내어준, 저 소나무의 마음을 보라
네가 한때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기대었던 내 어깨처럼,
편안하지 않은가
또다시 해변을 따라, 길게 뻗어나간 저 철길을 보라
기차가 밤을 다하여, 평생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 평행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 굳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평행을 이루어, 우리의 기차를 달리게 해야 한다.
기차를 떠나보내고, 정동진은 늘 혼자 남는다.
우리를 떠나보내고, 정동진은 울지 않는다.
수평선 너머로, 손수건을 흔드는 정동진은, 붉은 새벽 바다
어여뻐라. 너는 어느새 파도에 젖은, 햇살이 되어 있구나.
오늘은, 착한 갈매기 한 마리가, 너를 사랑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