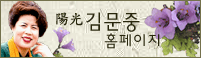백약시 - 시의 세계
글 수 316
늦저녁을 먹고나니
TV 연속극이 막을 내린다
아이들은 컴퓨터에 매달려
눈길 조차 주지 않는다
갈길이 바뻐 보이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메마른 내 손을 잡아끈다
머릿속까지 흔들리는 추석을 생각하면서
쓸쓸하다 참 쓸쓸하다 되뇌이며 밤거리를 나섰다
중노동에 시달린 듯한 여주인이
사정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가게방에서
오뎅, 옛날 크림빵, 도라지 두 갑을 사들고 나서니
길가에 늘어선 은행나무 옷벗는 소리
우수수 허공으로 흩어져 날린다
그 소리도 또 쓸쓸하다
비오는 거리를 속옷 젖을 만큼 걸어
점멸하는 신호등 불빛에 넋이 나가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본다
백여리 떨어져 도저히 이 시간에 나타날 것 같잖은
어릴 적 친구 상호가 별처럼 다가와 속삭인다
35년만에 만난 그 자리
거나하게 취한 깨복쟁이 친구들 산지사방 흩어질 때
내 손을 꼭 잡으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백원아, 너 참 멋있게 변했구나"
세상이 허전하고 쓸쓸할 때 그 친구가 보고싶다
사는 일에 힘이 부칠 때 그 친구의 한마디가
뼈마디가 아리도록 그립다
TV 연속극이 막을 내린다
아이들은 컴퓨터에 매달려
눈길 조차 주지 않는다
갈길이 바뻐 보이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메마른 내 손을 잡아끈다
머릿속까지 흔들리는 추석을 생각하면서
쓸쓸하다 참 쓸쓸하다 되뇌이며 밤거리를 나섰다
중노동에 시달린 듯한 여주인이
사정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가게방에서
오뎅, 옛날 크림빵, 도라지 두 갑을 사들고 나서니
길가에 늘어선 은행나무 옷벗는 소리
우수수 허공으로 흩어져 날린다
그 소리도 또 쓸쓸하다
비오는 거리를 속옷 젖을 만큼 걸어
점멸하는 신호등 불빛에 넋이 나가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본다
백여리 떨어져 도저히 이 시간에 나타날 것 같잖은
어릴 적 친구 상호가 별처럼 다가와 속삭인다
35년만에 만난 그 자리
거나하게 취한 깨복쟁이 친구들 산지사방 흩어질 때
내 손을 꼭 잡으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백원아, 너 참 멋있게 변했구나"
세상이 허전하고 쓸쓸할 때 그 친구가 보고싶다
사는 일에 힘이 부칠 때 그 친구의 한마디가
뼈마디가 아리도록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