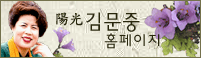백약시 - 시의 세계
글 수 316
그날 이후
눈이 쌓인 버스 터미널에 내려, 오가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물어본다.
기다리는 버스일수록 탈 곳을 감추고, 쉽게 몸을 내어 주지 않는다.
검은 대리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하얗게 부서지는 겨울 한 낮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 속에 침묵의 레일을 타고 오르는 기차가 보인다.
518번 버스는 어스름에 잠겨 목매이게 부르는 무등산을 지나가고,
하루가 다르게 하늘로 가는 세월의 높이는 헤아리기 힘든 쉰 목소리다.
비껴가는 길을 따라 달리는 낯선 만남의 시간에도 무언의 속삭임은 멈출 줄 모른다.
사위가 빠른 물살처럼 어두워진다.
자유로운 빛이 사라진 건널목을 지나 멀리 개짖는 소리가 들린다.
굳게 잠긴 담벼락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에 매달린
각목에 쇠기둥이 아프게 울더니, 찢겨진 깃발처럼 날리는 하얀 비닐들이 웃는다.
멀리서 들리는 군화소리에 꿍하고 가슴이 떨어진다.
모래에 새길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역사는 그리 쉽게 사라지질 않아 해마다 그 소리 가슴에 앉는다.
쿵쿵, 탕탕. 쿵쿵, 탕탕 ......
눈이 쌓인 버스 터미널에 내려, 오가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물어본다.
기다리는 버스일수록 탈 곳을 감추고, 쉽게 몸을 내어 주지 않는다.
검은 대리석에 새겨진 이름들이 하얗게 부서지는 겨울 한 낮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 속에 침묵의 레일을 타고 오르는 기차가 보인다.
518번 버스는 어스름에 잠겨 목매이게 부르는 무등산을 지나가고,
하루가 다르게 하늘로 가는 세월의 높이는 헤아리기 힘든 쉰 목소리다.
비껴가는 길을 따라 달리는 낯선 만남의 시간에도 무언의 속삭임은 멈출 줄 모른다.
사위가 빠른 물살처럼 어두워진다.
자유로운 빛이 사라진 건널목을 지나 멀리 개짖는 소리가 들린다.
굳게 잠긴 담벼락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고,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에 매달린
각목에 쇠기둥이 아프게 울더니, 찢겨진 깃발처럼 날리는 하얀 비닐들이 웃는다.
멀리서 들리는 군화소리에 꿍하고 가슴이 떨어진다.
모래에 새길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역사는 그리 쉽게 사라지질 않아 해마다 그 소리 가슴에 앉는다.
쿵쿵, 탕탕. 쿵쿵, 탕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