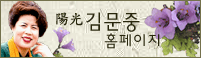백약시 - 시의 세계
글 수 316
보통리 저수지 건너
싸리꽃 피는 언덕 밑창에
그 여자가 산다
골짜기 물을 다 길어 부어도
속이 차지 않아
얼굴만 보고는
그 마음의 가장자리도 닿지 못하는
그 여자가 묵정밭을 간다
먹이를 찾는 짐승들이
온통 헤쳐 놓아 갈라질대로 갈라진 땅
손등이 터지도록 갈아 부쳐도
씨앗값도 건지지 못할 줄 알면서도
이를 갈며 불을 지른다
사방으로 길이 나고
슬픔의 흔적들이 제 모습을 들어낼 때면
그 여자의 정강이에 감도는 푸른 빛이 하늘에 닿는다
불빛이 사그러들고
물기마른 추억으로 노을이 지면
아직도 제 풀에 날뛰는 삽자루를
몸푸는 개울물소리에 씻기고
저녁연기 피워 올리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
썩을대로 썩은 내 마음의 묵정밭에도
아지랑이가 스멀거리고
바짓가랑이에 달라붙은 봄의 연기가
지나온 세월의 뒤안길로 자욱하다
싸리꽃 피는 언덕 밑창에
그 여자가 산다
골짜기 물을 다 길어 부어도
속이 차지 않아
얼굴만 보고는
그 마음의 가장자리도 닿지 못하는
그 여자가 묵정밭을 간다
먹이를 찾는 짐승들이
온통 헤쳐 놓아 갈라질대로 갈라진 땅
손등이 터지도록 갈아 부쳐도
씨앗값도 건지지 못할 줄 알면서도
이를 갈며 불을 지른다
사방으로 길이 나고
슬픔의 흔적들이 제 모습을 들어낼 때면
그 여자의 정강이에 감도는 푸른 빛이 하늘에 닿는다
불빛이 사그러들고
물기마른 추억으로 노을이 지면
아직도 제 풀에 날뛰는 삽자루를
몸푸는 개울물소리에 씻기고
저녁연기 피워 올리는 그 여자를 바라보면
썩을대로 썩은 내 마음의 묵정밭에도
아지랑이가 스멀거리고
바짓가랑이에 달라붙은 봄의 연기가
지나온 세월의 뒤안길로 자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