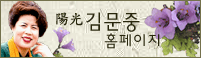추천시 - 시의 세계
시 한편 한편이 님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글 수 337
저 하늘 아래
황금찬
고향은
백년을 두고 물어도
영원한 모정이라고 하리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두고온 고원이라 일러두라
천애의 땅이 되지 않고
언젠가는 갈수있는 향관이라고
묻거든 대답하라.
그리움이 사무치면
잠들어도 눈감지 못하고
또 하나의 실향민의 은하수
밤하늘의 별이 되어
강물로 흐르네.
아! 이웃이여, 벗들이여
아침 창 앞에 낯설은 새 한 마리
날아와 울거든
남기고 온 정든 마을의 슬픈 소식이라
전해주고.
그날 문을 열고 서시어
잘 다녀오라 하시던
눈물에 젖은 어머님의 음성
다시 들을 수 있으려나.
구름으로 가교를 엮고
나비의 날개로 나르리라
눈썹 끝에 열리는 내 조국의 땅인데
산을 하나 넘어도 아득한 지평선
하늘이여 말해달라.
여기 풀잎 같은 마음을 모아
불망의 정을 기리고자 하늘에
비를 세우노라, 즈믄해가 여울로 흘러도
하늘의 비석은 이곳에 남게 하라.
황금찬
고향은
백년을 두고 물어도
영원한 모정이라고 하리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두고온 고원이라 일러두라
천애의 땅이 되지 않고
언젠가는 갈수있는 향관이라고
묻거든 대답하라.
그리움이 사무치면
잠들어도 눈감지 못하고
또 하나의 실향민의 은하수
밤하늘의 별이 되어
강물로 흐르네.
아! 이웃이여, 벗들이여
아침 창 앞에 낯설은 새 한 마리
날아와 울거든
남기고 온 정든 마을의 슬픈 소식이라
전해주고.
그날 문을 열고 서시어
잘 다녀오라 하시던
눈물에 젖은 어머님의 음성
다시 들을 수 있으려나.
구름으로 가교를 엮고
나비의 날개로 나르리라
눈썹 끝에 열리는 내 조국의 땅인데
산을 하나 넘어도 아득한 지평선
하늘이여 말해달라.
여기 풀잎 같은 마음을 모아
불망의 정을 기리고자 하늘에
비를 세우노라, 즈믄해가 여울로 흘러도
하늘의 비석은 이곳에 남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