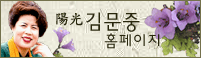추천시 - 시의 세계
시 한편 한편이 님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글 수 337
섬과 섬 사이에서
성 춘 복
섬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였고
둘 보다는 더 많은 바위들이
뿌리를 하나로 하고 물 속에
멱들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리기도 하였으나
얼마는 벅찬 마음으로
맑게 뿌려 놓은 별의 밤바다를
노 저어 갔습니다. 우리는
땀 밴 옷을 그대로 걸친 채
북두가 가리키는 방향에 키를 놓고
저문 길을 펼쳐 나갔습니다.
제 나라 땅의 제 바다에
오징어 배들이 맘껏 불을 밝히듯
졸음에 겨운 사람까지 일으켜
슬프고 참담해 옳을 물길을 진종일
물새가 울어 쌌는 소리로 달렸습니다.
철망 없어 펑퍼짐한 한 바다에
이제 나를 던져 금 긋고
그 주위에다 섬을 못질해 붙들어 앉히고
매일 머리 빗겨 가르마 타 주듯
섬과 섬 사이에 배를 놓았습니다.
바람막이 하나 없이
마른 침을 삼키는 저네들의
남 바다의 점 하나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섬과 섬
물살을 가르기 위해 우리는 왔습니다.
네 것이라 했고 내 것이라 했던
든든한 뿌리의 그 물들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그 땅과 그 바다에 오늘도 언제나의 아침 해가
빛나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 춘 복
섬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였고
둘 보다는 더 많은 바위들이
뿌리를 하나로 하고 물 속에
멱들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리기도 하였으나
얼마는 벅찬 마음으로
맑게 뿌려 놓은 별의 밤바다를
노 저어 갔습니다. 우리는
땀 밴 옷을 그대로 걸친 채
북두가 가리키는 방향에 키를 놓고
저문 길을 펼쳐 나갔습니다.
제 나라 땅의 제 바다에
오징어 배들이 맘껏 불을 밝히듯
졸음에 겨운 사람까지 일으켜
슬프고 참담해 옳을 물길을 진종일
물새가 울어 쌌는 소리로 달렸습니다.
철망 없어 펑퍼짐한 한 바다에
이제 나를 던져 금 긋고
그 주위에다 섬을 못질해 붙들어 앉히고
매일 머리 빗겨 가르마 타 주듯
섬과 섬 사이에 배를 놓았습니다.
바람막이 하나 없이
마른 침을 삼키는 저네들의
남 바다의 점 하나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섬과 섬
물살을 가르기 위해 우리는 왔습니다.
네 것이라 했고 내 것이라 했던
든든한 뿌리의 그 물들
동도(東島)와 서도(西島)
그 땅과 그 바다에 오늘도 언제나의 아침 해가
빛나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