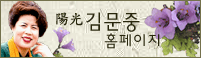추천시 - 시의 세계
시 한편 한편이 님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글 수 337
옛 고향
김어수
내 자라던 옛 고향을
오늘 다시 찾아드니
살던 오막사리
그도 마자 헐어졌고
어머니 물 깃던 샘도
묻혀지고 없구려
아버지 이 돌에서
밥때마다 불렀는데
가신지 그 동안에
四十년이 되단말가.
업드려 흐느끼는 이 자식
나도 털이 희였소.
봄이면 山藥캐고
가을이면 버섯 줍고
석양에 거적 깔고
통감 사략 읽던 곳이
어데가 어데 쯤인지
솔만 우묵하구려
지팡이 던지고서
잔디 밭에 앉았으니
어느덧 눈물 흘려
옷깃이 적셔지고
낯설은 젊은 사람들
힐끗 힐끗 보는걸.
고의 벗고 같이 놀던
그때의 어린 동무
모두 白首 老人되어
서로 봐도 모르다가
성명을 통하고 나서야
겨우 손을 잡다니.
내 심은 버드나무
아름넘는 古木인데
뒷산 진달래는
오늘도 붉어지고
시냇물은 흐르는 속에
어머니 얼굴 보이다.
김어수
내 자라던 옛 고향을
오늘 다시 찾아드니
살던 오막사리
그도 마자 헐어졌고
어머니 물 깃던 샘도
묻혀지고 없구려
아버지 이 돌에서
밥때마다 불렀는데
가신지 그 동안에
四十년이 되단말가.
업드려 흐느끼는 이 자식
나도 털이 희였소.
봄이면 山藥캐고
가을이면 버섯 줍고
석양에 거적 깔고
통감 사략 읽던 곳이
어데가 어데 쯤인지
솔만 우묵하구려
지팡이 던지고서
잔디 밭에 앉았으니
어느덧 눈물 흘려
옷깃이 적셔지고
낯설은 젊은 사람들
힐끗 힐끗 보는걸.
고의 벗고 같이 놀던
그때의 어린 동무
모두 白首 老人되어
서로 봐도 모르다가
성명을 통하고 나서야
겨우 손을 잡다니.
내 심은 버드나무
아름넘는 古木인데
뒷산 진달래는
오늘도 붉어지고
시냇물은 흐르는 속에
어머니 얼굴 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