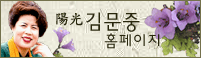동인지 원고 - 동인지
봄의 기억들
정선영
신길동에 살다 구의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아파트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용비교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는 강북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이라 차들은 모두 그길로 다녔다
그때가 4월 이었던 것 같은데 왕십리 근처 야산엔 진달래와 철쭉이 한창이었다. 5살 7살 아이를 키우던 내겐 그 꽃들은 앞으로 다가올 멋진 미래를 보여주듯 너무도 아름다웠다.
또 여의도로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며 출퇴근 하는 게 좋아보여서 구의동으로의 이사는 아무 망설임이 없이 결정되었다. 그때의 내 기억 속 봄은 너무 밝고 고와 삶은 영원히 아름다운 것으로 가슴에 그려졌다.
중학교 때일 것이다. 나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명동성당 옆의 계성 중학교를 다녔다.
그때 우리 집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었다. 강남이 막 발전하려는 때였던 그곳의 길은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아 봄이 시작할 무렵의 길은 한강의 바람에 꽁꽁 얼었던 땅이 녹는 봄날이면 진흙탕 길이 되었다. 학교에 갈 때는 구두에 흙을 안 묻히려 조심해서 걸어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먼저 학생화 그 까만 가죽구두를 닦아놓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두를 닦지 못하고 학교에 가게 되었다. 그날따라 봄의 햇빛은 왜 그리 좋은지 버스 안에 스미는 그 따듯한 봄볕에 나는 무기력하게 졸고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을 땐 난 나의 모습에 화가 나고 창피했다. 봄에게 나의 사춘기를 무참히 조롱받은 느낌이었다. 그때부터인가 난 봄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다.
며칠 전에 친구들과 모였다. 오랜만에 만나니 모두 반가웠다. 봄나물로 차려진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봄꽃구경 가자고 한다. 좀 전 모임에 오다 보니 구남초등학교안 나무들은 누군가 옅은 수채화 물감을 발라 놓은 듯 연녹색으로 물들고 구의공원의 나무들도 새 순을 내미느냐 분주해 보였다. 그날 만난 여인들은 봄의 날씨에 들뜨고 그 마음은 봄의 꽃에 뺏긴듯했다. 봄의 힘에 초목보다 그녀들이 더 들떠있는 것 같았다.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차를 마시며 앨범을 보니 나의 사진은 봄꽃과 함께 찍은 것이 제일 많아 보였다, 진달래에 속의 나는 웃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한사람의 반대쯤은 무시하고 다음 모임에 광릉수목원에 가기로 했다.
나는 나이를 봄에 먹는다. 남들과 같이 떡국을 먹는 설날 명절이 아니고 사월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봄날 햇볕에 늘어난 나의 얼굴의 주름을 보게 되고 원하진 않았지만 겨우 네 굵어진 허리 둘래를 봄옷을 입으며 알게 되고 손질 못하고 거칠어진 피부가 유난히 그때 더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겨울을 편하게 보낸 대가를 4월에 만나게 되어 나의 나이가 늘어남을 봄에 실감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탓을 봄에게 미루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아무리 봄이 싫다고 외면해도 봄은 망설임 없이 내게 왔고 나는 어정쩡하게 봄과 타협을 한다. 주위에 못 이겨 봄꽃 구경도 하고 몰래 내 시속에 봄을 사랑하는 척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속마음은 레이저 광선 같은 봄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봄은 심판의 계절이다. 가을의 결실보다 더 크게 지난해 겨울까지 노력한 결과가 봄에 한 점 숨김없이 나타난다. 나는 이제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섰다. 십대의 소녀처럼 투정 부릴 때도 아니고 삼십대 봄꽃에 기대어 미래를 꿈꾸지도 않는다. 이제 가는 시간이 아쉬워 감상적으로 꽃구경 다닐 때도 아니다. 이제는 이성으로 봄과 만나고 더 이상 봄을 피하지 않고 나만의 새싹을 나의 봄들에 키우려한다. 마음속 깊이 봄을 감사하며 사랑한다.
이글은 40대에 쓴 글 중 하나이며 스승님이 내게 주신 선물중 하나다.
오늘은 황금찬 선생님과 함께했던 봄이 떠오른다.
내 50대엔 매년 매월 매주 매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선생님과 시로써 함께 보냈다.
떠나신지 1년이 다가오는데 내겐 그저 힁성에 계신듯하다.
40대에 쓴 이글에 선생님과 함께 보낸 50대의 봄 이야기들을 이어 가겠다.
선생님 편안하시지요. 묻는 말에 “글쎄요, 누구도 알 수 없지요” 하시며 특유의 넉넉한 황금찬 미소를 지으시는 선생님의 모습 다시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