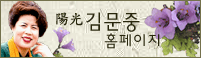동인지 원고 - 동인지
글 수 245
2017.03.01 03:01:39 (*.207.174.181)
579
공상 / 이광민
냉장고 소리도 잠든 새벽
멀리 달아난 잠의 꼭지를 잡으려 내달렸지만
마음은 멀리서 찾아올 그대를 맞이하고 있다
강원도 추위에 익숙할 만도 한 스물두 해
오늘 밤은 유난히 가슴이 시려
이불을 말아 안아보고 조끼를 덧입지만
비도 눈도 미세먼지도
모두 바람이 붙잡길 바라며
그대 오는 길, 꽃길이길 빌었다
하루쯤 잠, 그까잇 거 안 자도 좋다
호기 부리기엔 고갈된 체력
글을 짓기엔 늦은 시각도
이른 시각도 아니어서
딱 좋은 때
컴퓨터 앞에 정좌하지 않아도
노트북을 끌어안지 않아도
손전화 하나면 모두를 만나는 세상
스물두 해 지나면 또 어떤 새벽을 맞을까
ㅡㅡㅡㅡㅡㅡㅡ
욕객 / 이광민
한밤을 한숨에 잘 수 없게 된 날
뒤척거림은 아픔을 피하기 위함인데
잠은 다가오지 않고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
초췌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별빛에 가로등 빛 모아
온천을 찾아 나선다
뽀골파마를 한
회색 머리의 할머니 한 분과 나
몸을 씻고 탕으로 들어가려는데
발만 담그고 멍하니 계신 어르신
'어디가 편찮으신 걸까?'
문을 연 지 반 시간도 안 된 새벽
영하의 추위가 아직 떠도는데
한기를 느끼지 못하는 듯
발만 담그고 있는 할머니
탕 주위를 오리걸음으로 한 바퀴 돌다
벌떡 일어났다
둥둥 떠다니는 무언가를 보려는데
하얀 물거품이 뿜어져 나올 때마다 작아지고
망연자실한 욕객의 표정을 읽었다
작은 대야를 들고 백팔 번쯤 물을 퍼내었다
주인에게 물을 버리라 않고
아픈 팔로 퍼낸 건
초로한 여인의 절망이었을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말의 향기 / 이광민
남들은 일부러 욕하는 할매를 찾아
돈 주고 욕 먹으며 밥을 사 먹는다는데
청개구리 무늬를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유전자로
같은 소리를 두 번 듣기 싫은 건
메마른 하천에 거품이 이는
구정물을 보는 느낌이어서
무궁화 꽃잎 떨어지듯
한 번 듣고 잊어도
해바라기처럼 기다리고
바라봐주기를 소망하는 건
이기적일까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와라"*
백 년을 모아모아 이르신 말씀
국화 꽃잎만큼 하셔도
그윽한 향기 사라지지 않네
* 후백 황금찬 선생님의 시 "꽃의 말" 중에서
ㅡㅡㅡㅡㅡㅡㅡㅡ
이광민
imentoring@hanmail.net
1. 심선 이광민
2. 「문예운동」시부문 등단, 시낭송가
백양문학, 서울시단, 원주문학, 토지문학 동인
한국시낭송가협회 강원지부장
강원전통문화예술협회 문학분과장
공저 : 후백의 열매, 한.일 합동시집, 치악문원, 토지문학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