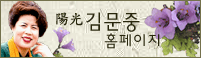동인지 원고 - 동인지
봄꽃처럼 활짝 핀 한글사랑..... 천국에서도 그 뜻 펼치소서
이근배
지금 이나라 산천은 꽃 만발입니다
선생님의 모국어 사랑, 한글사랑이 꽃과 더불어 활짝 피어나던
이 봄날 아침에 선생님은 홀연히 붓을 놓고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색동옷 입은 제자들이 부르던 시 "어머님의 아리랑"이
이 산 저 산 소쩍새들의 울음으로 들려옵니다.
나라 뺏긴 지 여덟 해 만에 태어나시어 여섯 살 때 할아버지가 가솔을 데리고
북간도 망명길에 가다가 함경북도 마천령 용솟골에서 머물러 사셨지요.
"10분의4는 집을 닯고 그 남은 6은 토굴"이었던 집에서 어머님의 아리랑은
함께 살아온 온 겨레의 아리랑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 시대의 노래입니다.
"한글/ 그 글자 속엔/ 어머님의 음성과 아버님의 음성이 숨쉬고 있다"(시 "한글")고
하셨듯이 일찍이 한글의 얼이 곧 나라의 얼임을 깨달으셨습니다.
1947년 월간지 "새사람"에 등단하셨으니 올해로 회방년(回榜年.등단60년)을 넘어
시력으로 고희를 맞으시는 해이기도 합니다.
후백 선생님! 선생님은 책 읽는 법, 글 쓰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으로 또는 품성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남달리 몸에 배기도 했지만 저의 눈에는 선생님의 풍모에서 예수만이
아닌 공자도 석가도 함께하심을 뵈올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문예창작과 학생들에게 저의 졸시 "겨울자연"을 칠판에 써놓고 모두 외우라고 하셨죠.
그러고는 저를 만나면 "이선생, 이제 시 그만 쓰세요. 그 시 하나면 됩니다" 하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찌 저에게뿐이겠습니까. 선후배 시인 모두에게 선생님은 늘 덕담을 해주셨고
따르는 후학들에게는 큰 스승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셨습니다.
해마다 선달이면 시낭송 모임 뒤풀이에서 소주 한 잔을 올리곤 햇습니다.
재작년 뵈올 때 제가 이백수(二白壽) 상수하시라고 제자들에게 박수 치게 한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손이라도 잡아보는 것인데..........
후백 선생님!
가시는 하늘나라에도 꽃들이 피겠지요. 입술이 파랗게 먹던 참꽃(진달래)도 있겠지요.
부디 그 나라 산천에 일 백 년 모국어 사랑! 더 높고 더 긴강 이루소서.
- 후학 이근배 곡만(哭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