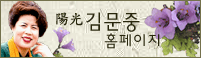동인지 원고 - 동인지
용대리 황태덕장
겨울 벌판
눈바람과 몸 썩어
투명한 육신으로 박제가 된다
해 지는 저녁
어두움 보다 먼저 찾아온
아득함
산이 되었다가
나목이 되었다가
장막이 되는 시린 삶
먼 바다의 그리움 접고
바람의 골짜기
흐트러짐 없이 꼿꼿하게
절개처럼 무릎세우는 신념
황태덕장 위에
다시 눈이 내린다.
싸리 꽃
8월 저녁이면
어머니는 등잔불 밑에서
횃댓보, 인두판으로
살아 오르던 그림들
어머니는 밤새 꿈꾸던
허상을 쓸어버리듯
싸리비 하나 들고
집 앞 큰 마당까지
가난을 쓸어 내셨다
철없는 자식들
가는 회초리
어린 종아리에 묻어나는
어머니의 눈물
유난히 흰 달빛이 시렸다
싸리 꽃물 오를 때
한해 풍년을 꿈꾸는
농기구들이 마당 한쪽을 차지하고
눈이 커다란 황소는 지난 세월을
되새김질한다.
헐벗은 시간을 견디고
제 몸 풀어 토해내는 뜨거운 해산
그리움의 꽃 차오르는 날
저녁노을 작은 어깨 위에
고운 꿈꾸는
어머님의 꽃수레 곱기만 하다.
쇠비름은
척박한 땅
질긴 한으로 피워 올린
노란 쇠비름 꽃
줄기마다
붉은 피 쏟아내던 여름
잠들지 못하는 하얀 뿌리
수 만 갈래 생의 더듬이
꽃자리 마련해 놓고
까만 가슴 토해내는
질긴 목숨 쇠비름
쑥스런 고백처럼
담 모퉁이 분홍빛 핏줄 돋우고 서있다
어머니와 마중물
더위에 지친 몸 일으켜
이슬 걷히기 전
남폿불 켜들고
새벽을 맞은 어머니
마당 한쪽 우물가
당신의 삶의 굴레
늘 담겨 있던
어머님의 마중물
몇 바가지 펌프에 부어
깊은 암반 속 끌어올린
정화수 한 사발
또 아침이 오면 그렇게……
옛이야기 되어버린 시간들
이제 골다공증으로
갖은 병 담고 사시는
내려앉은 육신
자식들 탓인 것 같아
내 마음의 마디도
이 밤 무겁게 무너져 내린다.
삼릉에서의 오후
외진 숲 속
꿩들이 짝을 부르는 가을 오후
여인들의 생 같은
국수나무 붉은 줄기
축축 늘어진 길 따라
혈관처럼 굽이쳐 도랑물 흐르고
오백 년 드넓은 능역 안은
그때 그 애비 호령소리
비감하다
가녀린 분의 홍살문
정자각 뒤로
커다란 봉분
외로이 지낸 흔적 섧다
적요의 능선 아래
역사 속 목숨들
꽃 수놓듯 살아낸
자매 왕후
가을걷이 하루가 바쁜 다람쥐
겨울잠 자러 올라오는 개구리
잎 열매 떨구는 때죽나무, 매자나무
지는 해
노란 낙엽 같은
삶의 무상함이여
약력
이름 : 정순임
월간 순수 문학시 등단
한국시낭송가협회, 시마을 문학회, 경의선 문학회 회원
현 경의선 문학회 시 낭송분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