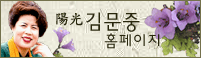문학회 원고 - 백양 문학회
글 수 1,490
황혼의 뜰
남궁란
저물어가는 노을 끝에
산허리 휘어잡은 달그림자
구름 속 담금질하다
뛰어나와 하늘을 마신다.
홍연히 달님을 벗하고 앉아서
가슴속 깊은 곳
추억을 풀어본다.
외길로 달려온 세월
어느새 종점이 눈앞인데
시야는 흐려지고
검은 머리 흰 서리 내려
골 패이고 일그러진 내 모습에
허허로운 찬사를 보낸다.
뜨락에 서서 하늘은 본다.
왜 나는 달고 가느냐고
대답 없이 흘러만 가는
달님 속에 나를 그려본다.
긴 터널을 지나
아름다운 나의 뜰이 여기 있음을
이제야 발 디디며
황혼의 뜰이라 부른다.
돌아볼 겨를없이 달려온 세월 속에
자식들 어느새 아름드리로 자라나고
늙는 게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임을
익을수록 단맛으로 넘치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