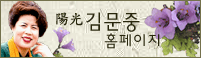문학회 원고 - 백양 문학회
글 수 1,490
선택
이광민
해돋이부터 비바람이 불었다.
막으려 애쓴 나무도 줄기가 꺾이고
노란 양지꽃마저
빗물에 쓸려 흙탕물에 흘러가고
내를 지나 바다 건너
해를 기다리며 지낸 궂은 날들
젖은 옷을 말릴 따스한 어떤 온기도
가슴 막히는 먹먹한 공간 속에서
검은 구름이 내려앉은 숨막히는 순간에도
끝을 선택하는 건 비겁한 일이기에
하루를 사는 게
해가 뜨고 지는 일보다 힘들었다.
언 손을 감각이 무뎌진 발을
얼어버린 가슴에 모을 힘조차 잠이 든
몽글몽글 뭉쳐진 낯선 구원의 말은
소리를 내어도 마음을 닫은 이에겐 들리지 않기에
꿈에서라도 소리질러 깨우고 싶었다.
뚫어진 가슴에
한 장 한 장 희망을 붙였다.
또 뚫리면 구겨진 종이라도
하나 하나 밀어넣었다.
사는 게 전쟁이었던 10년.
어둠을 몰아 낼
해돋이를 기다리는 일처럼
붉거나 노랗거나 빛나는
따사로운 봄날이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