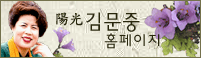강의노트 - 시낭송가 지도자 양성
글 수 123
2007.03.16 04:01:59 (*.140.167.81)
8521
길
작가 소개
김기림(金起林 1908-?) 함경북도 성진 생. 시인. 평론가. 보성고 졸. 일본 니혼대학 문학예술과를 거쳐 도호쿠제대 영문과 졸업. 1931-32년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사이에 “고대(苦待)”, “날개가 돋치면” 등 시각적 이미지가 선명한 시를 발표, 문단의 각광(脚光)을 받음. 1933년 이효석과 '구인회' 결성. 이양하, 최재서 등과 함께 주지주의 문학 이론 도입, 이후 한국적 모더니즘 문학 운동의 선구자가 됨. 시집에 <기상도(氣象圖)>(1939), <새 노래>(1947), 시론집에 <시론>(1947), <문장론신강>(1949). 6․25때 월북, 1988년 해금 조치. 작품 활동을 보면, 시 “기상도”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더니즘 이론을 충실히 이행하려 하였으며, 현대시가 지녀야 할 주지성과 회화성, 그리고 문명 비평적 태도 등을 시도하려 애썼다. 1940년대에는 시론을 발표하면서 “겨울의 노래”, “소곡” 등 서정과 지성이 결합된 선명한 시각적 영상이 두드러진 시를 발표했는데, 그의 문학사적 공적은 주지주의 시론의 확립, 과학적 방법의 도입, 모더니즘적 시의 시도 등이다.
시 전문
나의 소년 시절은 은(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喪輿)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江)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고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낳은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핵심 정리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율격 : 내재율
성격 : 애상적
제재 : 길. 헤어짐
주제 : 길 위로 여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상
출전 : <조광>(1936)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길을 바라보며 그 길에서 사람들을 생각하는 애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제재로 사용한 ‘길’은 ‘떠나보내는 길’이다. 그 길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여 길 위로 여읜 사람들을 추억한다. 어머니, 첫사랑, 잃어버린 기억 등을 길 위로 떠나보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의 길은 이별의 길이고, 망각의 길이며, 상심의 길이다. 길을 통해 그들을 찾으려 떠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길의 초입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생활 장소와 얽혀 있는 추억과 연결됨으로써 읽는 이의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길’은 ‘강’과 연결된다. 강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시적 화자는 언덕길 위에서 많은 것들을 떠나보낸다. 하지만 계속해서 떠나보내는 시적 화자가 오르내리는 길과 시적 화자를 오래 전부터 지켜보던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곳에 남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추억의 감정을 만들어 낸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강과 버드나무인 것이다.
작가 소개
김기림(金起林 1908-?) 함경북도 성진 생. 시인. 평론가. 보성고 졸. 일본 니혼대학 문학예술과를 거쳐 도호쿠제대 영문과 졸업. 1931-32년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사이에 “고대(苦待)”, “날개가 돋치면” 등 시각적 이미지가 선명한 시를 발표, 문단의 각광(脚光)을 받음. 1933년 이효석과 '구인회' 결성. 이양하, 최재서 등과 함께 주지주의 문학 이론 도입, 이후 한국적 모더니즘 문학 운동의 선구자가 됨. 시집에 <기상도(氣象圖)>(1939), <새 노래>(1947), 시론집에 <시론>(1947), <문장론신강>(1949). 6․25때 월북, 1988년 해금 조치. 작품 활동을 보면, 시 “기상도”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더니즘 이론을 충실히 이행하려 하였으며, 현대시가 지녀야 할 주지성과 회화성, 그리고 문명 비평적 태도 등을 시도하려 애썼다. 1940년대에는 시론을 발표하면서 “겨울의 노래”, “소곡” 등 서정과 지성이 결합된 선명한 시각적 영상이 두드러진 시를 발표했는데, 그의 문학사적 공적은 주지주의 시론의 확립, 과학적 방법의 도입, 모더니즘적 시의 시도 등이다.
시 전문
나의 소년 시절은 은(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喪輿)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江)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고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낳은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핵심 정리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율격 : 내재율
성격 : 애상적
제재 : 길. 헤어짐
주제 : 길 위로 여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상
출전 : <조광>(1936)
이해와 감상
이 시는 길을 바라보며 그 길에서 사람들을 생각하는 애상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제재로 사용한 ‘길’은 ‘떠나보내는 길’이다. 그 길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여 길 위로 여읜 사람들을 추억한다. 어머니, 첫사랑, 잃어버린 기억 등을 길 위로 떠나보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시의 길은 이별의 길이고, 망각의 길이며, 상심의 길이다. 길을 통해 그들을 찾으려 떠나거나 추적하지 않는다. 다만 그 길의 초입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생활 장소와 얽혀 있는 추억과 연결됨으로써 읽는 이의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길’은 ‘강’과 연결된다. 강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시적 화자는 언덕길 위에서 많은 것들을 떠나보낸다. 하지만 계속해서 떠나보내는 시적 화자가 오르내리는 길과 시적 화자를 오래 전부터 지켜보던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곳에 남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추억의 감정을 만들어 낸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강과 버드나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