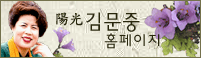강의노트 - 시낭송가 지도자 양성
글 수 123
2007.04.07 02:31:34 (*.148.225.249)
2087
시의 얼굴
오세영
時는
창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벽을 마주하고 쓰는 것이다.
하늘도 기실 하나의 거대한 벽일진대
헛된 희망에 속기보다는
절망으로 깨어나는 일이 더 고귀하다
푸른 하늘에 솟는 종달이의 꿈과
흰 벽지 위를 나는 파리의 아픔은
다르지 않는 법,
나는 차라리 벽에 부딪쳐
피흘리는, 책상 위의 일개 볼펜이 되리라.
시는 창문을 여는 일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일,
오늘도 누군가 벽을 깨는지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친다.
찰나의 밝음 속에 떠오르는
당신의 얼굴.
오세영
時는
창가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벽을 마주하고 쓰는 것이다.
하늘도 기실 하나의 거대한 벽일진대
헛된 희망에 속기보다는
절망으로 깨어나는 일이 더 고귀하다
푸른 하늘에 솟는 종달이의 꿈과
흰 벽지 위를 나는 파리의 아픔은
다르지 않는 법,
나는 차라리 벽에 부딪쳐
피흘리는, 책상 위의 일개 볼펜이 되리라.
시는 창문을 여는 일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일,
오늘도 누군가 벽을 깨는지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친다.
찰나의 밝음 속에 떠오르는
당신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