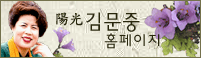추천시 - 시의 세계
시 한편 한편이 님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글 수 337
시래기국
詩.박무웅
그리움이란
속이 허전하면 밀려오는 배고픔 같은 것이다
내 어린 날은 처마 벽에 걸린
시래기 타래처럼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긴 겨울밤의 배고픔을 견디었다
지상의 천국이란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을 꿈꾸는 일이었다.
우리들의 유년기는 가난에 얼어 터져 쩍쩍 금이 갔다
오직 쓰러지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눈물로 받쳐 들던 시래기 국
지금은 온몸에 꽃 등심처럼 낀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 먹는다.
밤새워 울궈낸 사태국물보다 더 단백 한 이 맛
자본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식욕
일요일 아침 가족들과 둘러 앉아 시래기 국을 먹으며
어머니의 눈물처럼 목을 넘어가는 가슴에
뜨거움이 쳐 받쳐 오르는 것을
배고팠던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의 맛을
요즘 아이들은 모른다.
詩.박무웅
그리움이란
속이 허전하면 밀려오는 배고픔 같은 것이다
내 어린 날은 처마 벽에 걸린
시래기 타래처럼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긴 겨울밤의 배고픔을 견디었다
지상의 천국이란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을 꿈꾸는 일이었다.
우리들의 유년기는 가난에 얼어 터져 쩍쩍 금이 갔다
오직 쓰러지지 않기 위해
어머니가 눈물로 받쳐 들던 시래기 국
지금은 온몸에 꽃 등심처럼 낀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 먹는다.
밤새워 울궈낸 사태국물보다 더 단백 한 이 맛
자본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식욕
일요일 아침 가족들과 둘러 앉아 시래기 국을 먹으며
어머니의 눈물처럼 목을 넘어가는 가슴에
뜨거움이 쳐 받쳐 오르는 것을
배고팠던 겨울밤의 차가운 바람의 맛을
요즘 아이들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