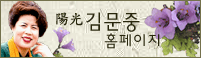추천시 - 시의 세계
시 한편 한편이 님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글 수 337
漢江에서
권일송
겨울이면
강물이 꽁꽁 얼어 붙었다
시름겨운 밤을 속으로 굽이치며
숨찬 가슴애피를 앓았다
시대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골짜기와 산들을 휘돌아
뗏목으로 흐르던 님은
지금은 멀리가고 없는데
둑을 무너뜨린 장마때 마다
통곡을 삼키곤 했다
어느날 한강은
내게와서 꽃으로 피어났다
깊숙이 땅을 덮고
어름짱을 깨고
봄 풀이 우줄우줄 자라는
언덕을 손짓하며
역사의 한 복판을 소용돌이 쳤던
저 천년의 물줄기
지금은 여남은개가 넘는다리
애증의 굴절이 심한
개나리 산천을 더수기에 끼고
이 땅의 퐁네프의 연인들이
사랑과 인생을 속삭이는 터전에
강심은 푸르고
도심의 네온이 보석을 뿌린듯 하다
흐르라, 강물이여, 망각의 적막강산이여
크게도 길게도 노래하는 너의 발자국
한숨인 다리 위에도 내일의 꿈은 부풀고
우리들의 가슴엔 이별 없는 손수건의 흐느낌이 있다.